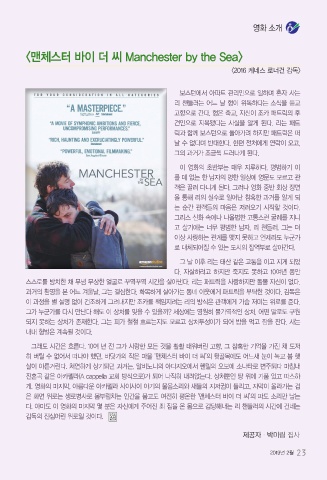Page 23 - 2019년 2월호 맑은샘
P. 23
영화 소개
<맨체스터 바이 더 씨 Manchester by the Sea>
<2016 케네스 로너건 감독>
보스턴에서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며 혼자 사는
리 챈들러는 어느 날 형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간다. 형은 죽고, 자신이 조카 패트릭의 후
견인으로 지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리는 패트
릭과 함께 보스턴으로 돌아가려 하지만 패트릭은 떠
날 수 없다며 반대한다. 한편 전처에게 연락이 오고,
그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게 된다.
이 영화의 초반부는 매우 지루하다. 평범하기 이
를 데 없는 한 남자의 멍한 일상에 영문도 모르고 관
객은 끌려 다니게 된다. 그러나 영화 중반 회상 장면
을 통해 리의 실수로 일어난 참혹한 과거를 알게 되
는 순간 관객들의 마음은 저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스 신화 속에나 나올법한 고통스런 굴레를 지니
고 살기에는 너무 평범한 남자, 리 챈들러. 그는 더
이상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언제라도 누군가
로 대체되어질 수 있는 도시의 잡역부로 살아간다.
그 날 이후 리는 태산 같은 고통을 이고 지게 되었
다. 자살하려고 하지만 죽지도 못하고 10여년 동안
스스로를 방치한 채 무념 무상한 얼굴로 꾸역꾸역 시간을 살아낸다. 리는 패트릭을 사랑하지만 돌볼 자신이 없다.
과거의 환영을 본 어느 겨울날, 그는 결심한다. 화목하게 살아가는 동네 이웃에게 패트릭을 부탁한 것이다. 감독은
이 과정을 별 설명 없이 건조하게 그려내지만 조카를 책임지려는 리의 방식은 관객에게 가슴 저미는 위로를 준다.
그가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 해도 이 상처를 잊을 수 있을까? 세상에는 영원히 불가역적인 상처, 어떤 말로도 구원
되지 못하는 상처가 존재한다. 그는 피가 철철 흐르는지도 모르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밥을 먹고 잠을 잔다. 사는
내내 형벌은 계속될 것이다.
그래도 시간은 흐른다. 10여 년 전 그가 사랑한 모든 것을 활활 태워버린 고향, 그 참혹한 기억을 가진 채 도저
히 버틸 수 없어서 떠나야 했던, 바닷가의 작은 마을 ‘맨체스터 바이 더 씨’의 뒷골목에도 어느새 눈이 녹고 봄 햇
살이 아른거린다. 처연하게 상기되던 과거는, 알비노니의 아다지오에서 헨델의 오보에 소나타로 변주되다 마침내
진혼곡 같은 아카펠라(A cappella 교회 방식으로)가 되어 나직히 내려앉는다. 상처뿐인 땅 위에 기품 있고 따스하
게. 영화의 마지막, 아름다운 아카펠라 사이사이 아기의 울음소리와 새들의 지저귐이 들리고, 자막이 올라가는 검
은 화면 위로는 생로병사로 몸부림치는 인간을 품고도 여전히 평온한 ‘맨체스터 바이 더 씨’의 파도 소리만 남는
다. 아마도 이 영화의 마지막 몇 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죄 짐을 온 몸으로 감당해내는 리 챈들러의 시간에 건네는
감독의 진심어린 위로일 것이다.
제공자·박미림 집사
2018년 7월 23 23
2019년 2월